2015/04/19 김석범 선생님은 민족주의자
김석범 선생님에 관해서 이전에 [김석범 선생님과의 대화]로 2012년 5월 27일에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어제 찍은 선생님 사진을 추가로 올립니다.
오늘 동경 날씨는 청명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찬란했다고 할까, 마치 특수한 조명처럼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읽을 책이 밀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하던 것들을 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진도가 별로 안 나갑니다.. 입이 출출해서 팝콘을 한 양푼 만들어서 먹으니 맛있게 금방 먹힙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팝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너무 많더군요. 먹다가 남겼습니다. 책이 별로 안 읽혀서 두 권만 읽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가기 싫었지만, 팝콘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상합니다. 소화가 안된다고 할까.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러 길을 나섰지요. 걸어서 왕복 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책을 반납하고 오는 길에 학교 마당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25년 다녔는데도 그 산에 못 올라가 봐서 갑자기 올라가기로 했지요. 올라가는 길도 잘 몰라서 산을 돌다가 무조건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만저만 가파른 게 아니에요.. 길도 없고 아주 가파라서 올라가면서 걱정을 했지요. 내려올 엄두가 안 납니다. 어쨌든 올라가서 보니 옛날에 소문을 들었던 작은 신사 같은 게 있고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 계단을 내려왔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그래도 정상을 정복한 성취감이 있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서 헌책방에 들러서 잡지를 한 권 사서 왔더니 두 시간 정도 걸었더군요. 이 걸로 저녁산책을 한 셈으로 치렵니다.
김석범 선생님과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김석범 선생님은 재일 제주도 사람 일세 지식인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일 제주도 사람 일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1925년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세입니다. 그러나, 일세 같은 이세입니다. 1925년이면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로 이주를 시작한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태어나 자라고 젊을 때까지 지낸 건 제주도 사람들의 집거지인 이카이노였습니다. 그 당시는 학교외에 생활언어는 제줏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제주도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거지요. 그러나 자신은 1940년 제주도에 가기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받아서 ‘황국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황국 소년’이라는 건 "자신도 천황폐하의 아이로서 천황폐하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당시 대부분의 재일동포나 재일 제주도 사람 일세 지식인들이 가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1940년에 제주도 고향에 가서 일 년정도 지냈다고 합니다. 제주도 고향마을에서 지내는 동안에 선생님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혁명’이였던 것은 ‘제주도의 자연’과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과 달리 일본이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반일’이었고, ‘민족주의’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약간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재일동포 일세나 지식인들은 일본이 패전 후에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급속히 ‘조선인으로서 민족주의’에 눈떠가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노동운동을 리드한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수라고 할 수 있지요. 선생님도 그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중국으로 가려고 서울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는 못 갑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이카이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일제하 교육에서 ‘조선인’으로서 뭔가 열등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보는 ‘일본 사람’들과 주변에서 보는 일본말도 못 하는 ‘제주 아주머니’들과 이질감을 느꼈겠지요. 그 게 제주도 고향마을에서 지내면서 ‘제주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까, 식민지 출신 ‘황국 소년’에서 ‘제주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소년 때 경험한 제주도 자연이, 고향마을에서 본 제주도 사람들 생활이 그 후 선생님이 소설을 써가는 데 원동력이자, ‘원풍경’이 됩니다. 소설을 써서 발표하기 시작한 게 195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5년이나 쓰고 있는 소설이, 소년 때 일 년 동안 제주도 고향마을에서 경험했던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만 썼거든요. 사실 제주도 출신 작가들은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러나 김석범 선생님처럼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만 전문적으로 끈질기게 쓴 사람은 없지요. 이 게 제주도 사람이라는 ‘운명’ 일지도 모릅니다. 재일 제주도 사람 일세들에게 ‘민족적’인 것은 ‘제주도적’인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하 ‘조선인’으로 성장해서, 일본이 패전 후 ‘조국’에서는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분단이 됩니다. 재일동포가 보는 관점에서, 북한은 표면적으로나마 ‘친일’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친일’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민족이 자주독립’을 못한 상태로 봅니다. 당시 대부분의 재일동포 지식인들은 북한이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통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북한 쪽 조직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 경향이 뚜렷해질 때, 많은 지식인이 북한 쪽 조직에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 '삼천리'라는 잡지였지요.
북한 쪽 조직에서는 이 분들을 ‘조국을 배반한 남조선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좌경’이었지요.. 그러나 이 분들이 생각은 ‘통일된 조국’만이 진정한 조국이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나, 한국이라는 분단한 국가는 조국이 아니라는 거지요.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 대부분이 한국 정부의 끈질긴 공작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향은 한국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향에 가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고향에 대한 집착 또한 대단합니다. 어디까지나 고향이었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통일된 조국’이 아니면 돌아갈 조국은 없다며 고향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으면서도,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석범 선생님도 ‘나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민족주의자’라고 하더군요. 이 게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민족주의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경우 ‘조선적’이라는 건 ‘국적’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렴요, 이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기 전, 북쪽에 있는 나라가 성립되기 한참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쪼록,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통일된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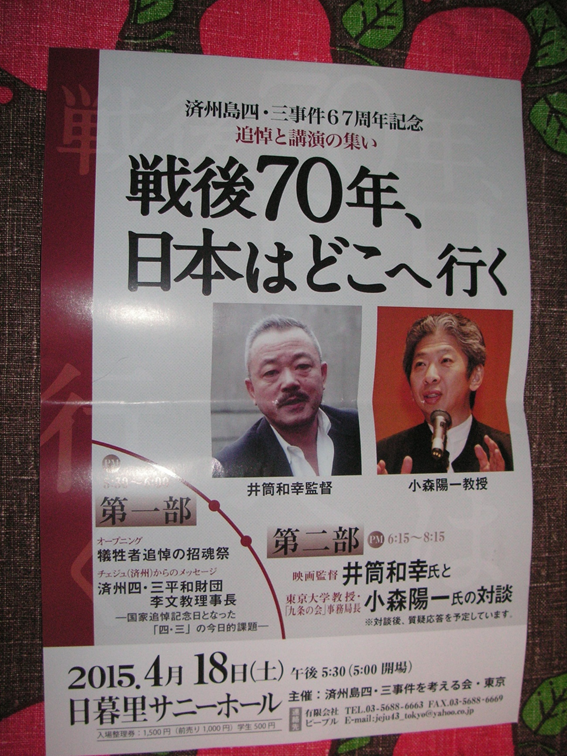
'재일 제주도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석범 선생님과의 대화 (0) | 2020.05.30 |
|---|---|
| 김석범 선생님 (0) | 2020.05.30 |
| 바다를 따라서 (0) | 2020.03.22 |
| 필드의 성과 (0) | 2020.03.18 |
| 짐 싸기 (0) | 2020.03.08 |



